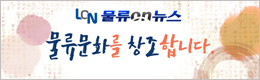아들아!
가을이 저렇게 소리도 없이 왔다.
마당가의 석류나무가
네 주먹만한 열매를 맺었구나.
작년에도 두 알이더니
올해에도 변함없이 딱 그대로다.
석류나무는 더 굵은 열매들을,
더 많이 주렁주렁 매달아
우리한테 보여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도 그만 힘이 부쳤나 보다.
나뭇가지가 턱없이 가늘어서
석류 두 알도 저렇게
간신히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아들아,
석류나무 밑동에 여린 줄기들이
오종종 모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석류나무가 어린 새끼들을 데리고
함께 자란다고 말하지.
먹여 살려야 할 식솔이
많이 딸린 가장을 보는 것 같단다.
그 새끼들은 어미의 뿌리에서 나온 것들인데,
어미가 취해야 할 양분을 빨아먹고 자란단다.
하지만 어미 석류나무한테서
실한 열매를 얻으려는 생각으로
나는 그 어린 것들을 이따금 잘라주곤 했었다.
매정하고 아까운 일이지만 할 수가 없었지.
나는 또 지난 여름
땅으로 낭자하게 뚝뚝 떨어지던
그 많은 석류꽃들을 생각한다.
아들아,
너는 주홍빛 석류꽃을 기억하느냐?
석류꽃도 봄날의 동백꽃처럼 온몸을
송두리째 내던지며 처연하게 진단다.
한잎 한잎 나풀거리지 않고
꽃받침에서 몸을 떼는 순간,
마치 결심한 듯이
아무 주저함도 없이 낙화하는 꽃이란다.
제 빛깔이 채 바래기도 전에
지고 마는 꽃을 보면서
나는 왠지 아깝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다.
아들아,
내가 목이 댕강 떨어진 석류꽃을
몇개 주워 들고 들여다보고 있을 때였다.
네 할머니께서 물끄러미 나를 보시더니
무슨 청승이냐는 듯 한마디 던지셨지.
'꽃이 그냥 지는 줄 아나?
지는 꽃이 있어야 피는 꽃도 있는 게야.'
네 할머니는 지는 꽃 때문에
석류알이 굵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였다.
꽃 지는 것 보며 공연히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필요가 뭐 있겠느냐며 웃으셨지.
아들아, 알겠느냐?
그러니까 저 석류 두 알은
저 혼자의 힘으로 열매가 된 게 아니라는 말이다.
지난 여름 땅으로 떨어져간 수 백송이의 꽃들,
그 지는 꽃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열매가 맺힌 거란다.
아들아,
아직 너는 어려서
언제든 화사하게 피는 꽃이 되고 싶겠지.
하지만 지는 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사과 한 알을 먹을 때에도
그 사과를 위해 떨어져간 수많은 사과꽃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오늘 아침 네가 떠먹는 한 숟갈의 밥에도
농민들의 땀방울과 뜨거운 햇살과
바람소리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리하여 이 가을에는
부디 그 앞에서 겸손해지기 바란다.
언젠가 네가 학교에 갔다가
흠씬 두들겨 맞고 돌아온 적이 있었다.
한쪽 눈두덩이 시퍼렇게 부어오른 것을 보고
나는 그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지.
“너도 그 자식 한대 세게 때려주지 그랬어?”
그때 네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지.
“아니다, 굳이 그럴 거 없다.
지는 게 나중에는 이기는 거란다”.
그 때 할머니의 그 말씀을
한참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야
나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단다.
아들아,
대부분 사람들은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 말을 전폭적으로 믿지는 마라.
세상에는 승리한 사람보다는
실패한 사람이 많고,
실패한 사람 때문에
승리한 사람이 두드러져 보이는 법이란다.
지는 꽃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다고 너한테 늘 실패하는
인간이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실패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패 앞에서 기죽지 않을 용기도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들아,
네 할머니가 누구시냐?
계단을 오를 때면
몇 걸음 못가 숨을 내쉬어야 하고,
이제는 꽃으로 따진다면
바로 지는 꽃이 아니겠느냐.
그 지는 꽃 때문에 이 아비는 아비대로
세상을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고,
또 너의 키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 가는 게 아니겠느냐?
- 안도현 / "아들아,지는 꽃의 힘을 아느냐" [2003년,'올해의 문장상' - 수필부문 수상작품]




-
- 사진 / Don Paulson photograp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