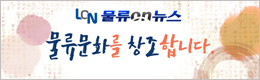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새벽마다 등산할 때, 소나무 수백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소나무숲 벤치에서 잠시 쉬곤 한다.
솔향을 맡으면서 명상도 하고, 소나무숲에서 살고 있는 다람쥐와 까치와 참새가 함께 노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솔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새벽 나는 내가 던져준 과자를 보고 달려든 다람쥐 3마리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가까이서 본 다람쥐 3마리의 얼굴이 다 달랐기 때문이다.
나는 순간 3마리 다람쥐에게 ‘다롱이’, ‘다순이’, ‘다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
그리고 참새나 까치도 사람과 같이 분명 얼굴이 다 다를 것이고, 그래서 각각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소나무숲에 있는 수백 그루의 소나무 역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무리 관찰해도 소나무의 얼굴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나무 가지나 잎의 모양이 다 똑같아 수백 개의 소나무를 구분할 수 없었다.
나는 얼굴 없는 나무는 이름도 없어 불쌍한 존재라는 생각과 함께 하산을 서둘렀다.
그런데 벤치에서 일어서자마자, 모든 소나무의 각각 다른 얼굴이 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각각 다른 소나무의 얼굴은 바로 수피(나무껍질)였다.
다람쥐도 참새도 까치도 사람처럼 다 얼굴이 달라 이름을 가질 수 있듯이, 모든 소나무도 껍질의 모양이 다 달라 각각 이름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하산하면서 상수리나무 역시 모두 제각기 다른 껍질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나무껍질은 굵직한 게 남성의 얼굴 같았고, 상수리나무껍질은 가느다란 게 여성의 얼굴 같았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아름다운 꽃은 나무의 얼굴로, 그리고 비바람과 추위로부터 나무를 보호해주고 해충이나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나무껍질은 나무의 옷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얼굴에 생명과 가장 밀접한 호흡 기능인 코가 있듯이, 나무껍질에도 나무의 숨구멍이 제일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나무껍질을 나무의 얼굴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무엇보다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얼(혼)이 나타나는 꼴(모양)의 의미로,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나무껍질도 나무의 뿌리와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에, 나무껍질을 나무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나무껍질을 나무의 피부라는 의미로 수피(樹皮)라고 하는데, 수피가 사람의 얼굴처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나무껍질을 ‘수피얼굴’이라고 명명해주고 싶다.
지금까지는 서식지에 모여 있는 수많은 철새 두루미나 군락지에 모여 있는 수많은 전나무를 보면서 그냥 모두 같은 두루미나 전나무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두루미나 전나무의 얼굴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름도 각각 있다는 것을 인정할 생각이다.
나는 하산하면서 앞으로 두루미나 전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나 식물도 다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연을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누군지 알 수 있듯이, 나무껍질을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으려면, 모든 나무에도 이름을 지어줘야 할 것 같다.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이, 수피의 얼굴도 다 다르기 때문이다.
[단상]
대한민국에 사는 5000만 한국 사람의 얼굴이 다 달라 각자 이름이 있듯이, 소나무숲에 서있는 수백 그루 소나무도 수피(나무껍질)가 다 달라 각각의 이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5월의 마지막 주말을 보람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