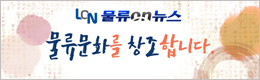金杉基 / 시인, 칼럼리스트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초 시골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던 나에게는 지금도 새마을운동 관련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시골 마을에 회관이 지어졌고, 회관 옆에는 항상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시멘트가 쌓여 있었고, 집집마다 지붕을 볏짚에서 슬레이트로 개량했고,
학생들은 매일 새벽 ‘새벽종이 울렸네,’로 시작하는 새마을운동 노래를 들으면서 동네 골목길을 청소했다.
특히 장마철이면 마을 어귀의 200m쯤 되는 비포장도로가 진흙탕 길로 변해, 당시 면사무소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1인당 장화를 한 켤레씩 무상으로 지원해줬다.
그리고 내가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때, 면사무소 직원이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전체 금액 중 장화 지원금이 1/5을 차지하여, 다른 부분에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고,
결국 이듬해 정부지원금과 마을회비 그리고 마을의 청년들과 어른들의 노동력 동원으로 비포장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하게 되었다.
만약 면사무소 직원의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시골 마을은 계속 정부의 전체 지원금의 1/5을 장화 지원받는데 사용해야 했고, 그래서 다른 분야가 더디게 발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됐을 것이다.
마을 어귀 진흙탕 도로가 포장된 이후, 시골 마을에서는 더 이상 장화를 볼 수가 없게 되었고, 그 포장도로를 지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새마을운동은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의미 외에, 대한민국 최초의 복지정책 실천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복지정책이 개인에게 퍼주는 복지가 아닌 공공부문 투자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공복지였고,
단기적으로는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비절감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경제적인 복지였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고 우리나라도 부자가 되었으니, 정부의 복지정책도 옛날과 다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공공복지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평등과 기회균등인데, 평등 아래 있는 개인에게는 무상 복지정책을 펴서 억지로 불편한 평등을 만들고, 평등 위에 있는 개인에게는 기회균등의 룰을 깨면서 불편한 평등을 이해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긴급한 현안문제에는 50년 전 시골 마을에 장화를 지원하듯 무상지원을 해야 하지만, 아무 대책도 없이 계속 퍼주는 빙식으로 기회균등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난 15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선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그 규모가 최소 12조 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1,2,3차 재난지원금도 수십조 원으로 지금까지 엄청난 금액이 지급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임을 생각하니 우리나라 재정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가 우선 급한 불을 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제는 50년 전 시골 마을에서 장화를 지급하는 대신 도로포장을 주장했던 면사무소 직원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중요하지만, 백신 개발이나 구입에 과감하게 투자할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 조직도 더 확대하고, 또한 쓰러져가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를 회생시킬 수 있는 신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지자체는 지자체 주민으로 등록된 모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반절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반절도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도록 도와준다고 한다.
차라리 50년 전 면사무소에서 시골 마을에 장화를 지원하는 대신 도로포장을 해주듯, 그 지자체가 개인에게 등록금을 주는 대신 등록금 없는 훌륭한 대학을 세워 지자체 대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는 어려운 개인에게 복지 장화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누구나 똑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복지 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때임을 우리 정부나 사회가 명심해야 한다.
[단상]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새마을운동 정신이 사라졌는데도, 대한민국이 새마을운동을 수출하고 있다 하니, 신상품이 아닌 케케묵은 재고상품을 파는 것 같아 씁쓸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