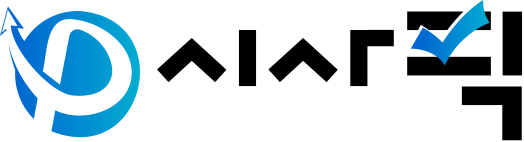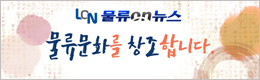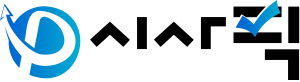김삼기 / 시인, 칼럼니스트
몇 년 전부터 존경하는 두 분의 메시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내 카톡에 도착하고 있다.
먼저 새벽 5시 40분 도착하는 ‘책속의 한줄’은 삶의 지침이 되는 글이고, 7시 20분경 도착하는 ‘아침 3분 공감’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다스리기에 좋은 글이다.
나는 다른 분들의 메시지도 카톡으로 받으면 꼭 읽는 편이지만, 위 두 분의 메시지는 언제나 정해진 아침 시간대에 받는 글이라,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다.
그래서 나는 평소 위 두 분이 보내는 메시지를 차가운 머리로 읽지 않고, 따뜻한 가슴으로 읽는 편이다.
분명히 분별력 있는 머리로 읽어야 하는데, 나는 왜 따뜻한 가슴으로 읽고 있는 것일까?
아마 내가 존경하는 두 분을 항상 내 마음의 좋은 공간에 담아두고 있어서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생각이나 감정 따위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인 마음도 가슴에 있지 않고, 머리(뇌)에 있는데, 나는 왜 가슴으로 위 두 분의 메시를 읽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흔히 머리에 있는 마음을 가슴에 있다고 여기고, 심한 경우는 마음과 가슴을 같은 의미로 이해하기도 한다.
분명히 마음은 가슴에 있지 않고 머리에 있는 데도,,,
그러니까 커다란 충격을 받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해야 하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표현할 때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이 망하거나 승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지만, 자식이 잘못되거나 부모님이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위 예에서 머리는 냉철한 분별력이 동반되고, 가슴은 따뜻한 사랑이 동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식이 잘못되거나 부모님이 아픈 상황에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식이나 부모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쉽게 나오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물주가 심장을 머리에 두지 않고, 가슴에 둔 이유가 이성적인 사고는 머리에서 하되, 감성적인 사고는 가슴에서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그리고 머리에서는 지식이라는 요소를, 가슴에서는 사랑이라는 요소를 사용하도록 구분해 놓은 것 같다.
나는 오늘부터 의도적으로라도 머리로 읽을 메시지와 가슴으로 읽을 메시지를 구분해서 읽을 생각이다.
지적이거나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메시지는 머리로 읽고, 친구나 고향 등과 같이 정이 듬뿍 담긴 메시지는 가슴으로 읽을 생각이다.
어제(1.26) 42년 교단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식을 한 친구가 평소 자주 했던 말이 생각났다.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호랑이 같은 선생님으로, 교단에서 내려와 학생들을 대할 때는 천사 같은 선생님으로 살아왔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통해 음악회와 함께 진행된 친구의 정년퇴임식을 보면서, 교단에서는 머리로, 교단을 내려와서는 가슴으로 살아온 친구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마음이 머리에 있지만, 마음 중에서 사랑이 필요한 마음은 심장이 있는 따뜻한 가슴으로 보내, 마음을 더 빛나게 만드는 조물주에게 감사해야 할 것 같다.
흑산도에서 홍어가 올라왔다며 나를 초대한 후배의 전화 목소리 역시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슴의 목소리였다.
[단상]
설 연휴는 머리보다 가슴으로 보내기 좋은 기간입니다.
따뜻한 설 연휴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