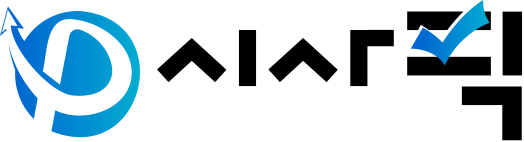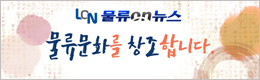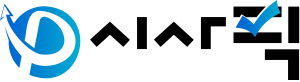金杉基 / 시인, 칼럼리스트
중국은 한반도와 육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침략과 내정간섭 등으로 근세까지 가장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였다.
일본 역시 한반도와 해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지만,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어, 우리나라와는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로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다.
6.25전쟁으로 나라가 나뉘면서 북한 또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가장 먼 나라가 되어 왕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해방 이후 지금까지 2억만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원래 가까운 나라와 사이가 좋아야 경제나 문화 교류에서 손실이 적은데, 우리나라가 가까운 나라와는 멀리하고 먼 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뭔가 순리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중국이나 일본과는 전쟁이라는 치명적인 상처를, 북한과는 분단이라는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깝지만 먼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가까운 나라들과 어쩔수 없이 밀접한 교류를 하고 있는데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이 안타깝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웃해 있는 지역으로 가장 가까운 데, 오랜 기간 동안 지역갈등의 벽을 넘지 못해 자금까지도 가장 먼 관계로 지내오고 있다.
아파트단지에서도 가장 가까운 옆집이니 위아래층 집이 층간소음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가장 먼 사이가 되어 인사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편이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대부분 성격이나 이성 관련 갈등으로 인해 가장 먼 사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태평성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웃지역이나 이웃집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부부간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가까운데 먼 '근원(近遠)의 원칙'라는 마술에 걸려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톨스토이는 과거나 미래같이 먼 시간 보다 우리에게 가까운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현재 하는 일과 현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70세가 되었을 때, “가끔 만나는 소위 잘나가는 고관들 보다 매일 옆에서 자신을 도와주는 타이피스트가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고 말했던 것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나 일이나 그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근근(近近)의 원칙'라 할 수 있는데, '근근의 원칙'으로 살아야 우리가 가장 순리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근원(近遠)의 원칙'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제는 현재 내가 어디에 서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위치에서 '근근(近近)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혹시 가장 가까이서 날마다 만나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보다 가끔 만나는 지인이나 이해관계자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도 점검해봐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과도 '근근의 원칙'이, 이웃지역이나 이웃집이나 부부 관계도 '근근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내가 쓰고 있는 ‘멀리서 다가오는 단상’도 멀리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나에게 다가온 내 주변의 것들이 주요 소재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점심 식사를 한다면, 식탁에 올라온 밥이나 반찬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땅이나 바다나 공중 중 어디엔가 멀리서 자라다가 여러 과정을 거쳐 오늘 식탁에 올라왔다는 게 ‘멀리서 다가오는’의 의미다.
‘멀리서 다가오는 단상’을 내가 '근근의 원칙'에 의해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편하고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다.
"가까운 곳에 답이 있다"는 게 '근근(近近)의 원칙'의 핵심이다.
한편 '원근(遠近)의 원칙'은 미국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깝게 지내는 경우로, 가족이나 친구 등이 '원근의 원칙'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상]
오늘은 단상 타이틀을 ‘가까이서 다가오는 단상’으로 바꿨습니다.
('근근의 원칙', '근원의 원칙', '원근의 원칙'은 제가 명명한 것이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